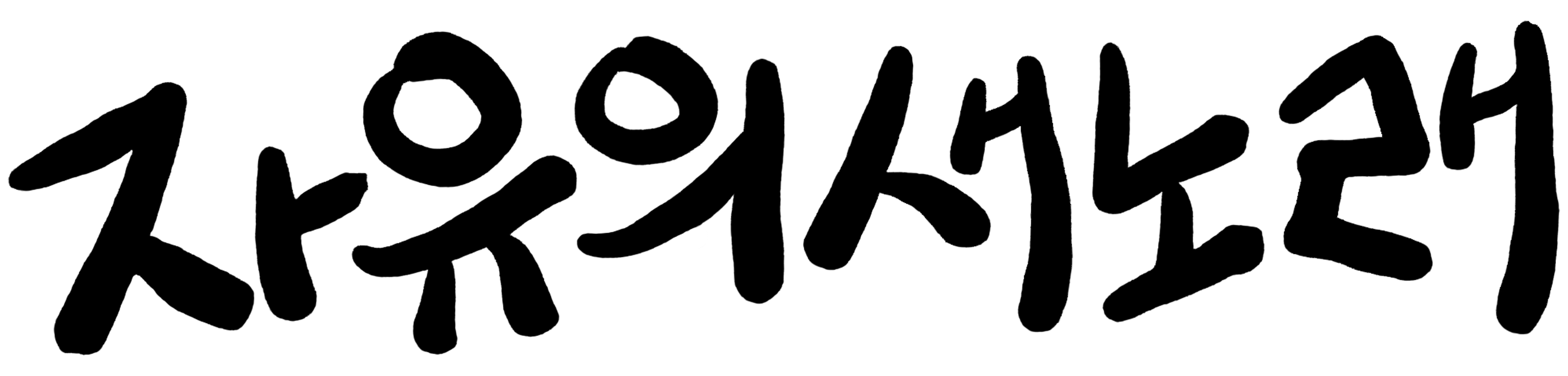어디에도 집단 감염을 보도하는 데가 없었다. 다양한 사건들이 사람들 기억에서 코로나 세 글자를 밀어냈고, 발병하고 정확히 2년하고도 반년이 지나서야 다른 뉴스들로 뒤덮였다. 뉴스로 뉴스를 덮는다, 이거 현실 정치에서도 유용하겠지만 여자와 남자 사이 관계에서도 무척이나 유효하다. 오늘처럼 적당히 쓴 알콜로도 애매한 기운을 덮기가 어렵다면 말이다. 한 달이 지나도 응답 없음 유지하던 우리 관계도 잠시 주춤하는 건지 영원히 멀어지는 건지.
발걸음도 주춤했다. 지하철 환승 통로 한 편에 마련한 전시회에 다다른 직후였다. 익숙한 전신의 찰리 채플린이란 점 때문만이 아니었다. 머리에서 분리된 얼굴, 부르튼 발에서 벗겨진 신발, 천사의 날개를 겨드랑이에 끼운,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마르크 샤갈 냄새. 웃고는 있지만 그림에서 느껴지는 채플린의 표정은 밝지 않다. 광대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채플린의 영화 <키드>(The Kid)를 보면 샤갈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만 같다. 결코 사람의 얼굴은 한 가지 표정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화사한 그림도 낯익다. 붉은 배경의 꽃다발. 1970. 피카소에 대한 일화를 접하고 그날부터 피카소를 시기한 샤갈이 와 닿았기 시작했다. 상처받기 쉬운 그의 작품 앞에 서면 고스란히 마음이 보이는 투명한 유리가 느껴진다. 붉은 배경이라 파랗고 보랏빛 하얀 얼룩한 꽃들이 돋보이는 작품에서 피카소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샤갈을 상상했다. 구석에서 유령처럼 서 있는 정장과 웨딩드레스는 누가 봐도 사랑을 의미한다. 풋풋했던 사랑이 떠올랐다. 다시 시를 써볼까 싶었다. 그림 그릴 줄 모르니 노래 가사처럼 한 구절 끼적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뉴스로 뉴스를 덮듯, 하고 싶은 일로 슬픈 마음을 덮어 버리기.
일에 치여 전시회도 가지 못하는 날이면 우리는 놀러가듯 서점으로 향했다. 배워본 일 하나 없는 미학 용어 늘여놓기 일쑤지만 책 하나 들고 버티다 보면 뒤에서 안아주던 향기에 서점 냄새가 덮이고 말았다. 잔잔한 음악도 귓가에 속삭이는 끈끈한 말들로 덮이는 것처럼, 끝끝내 흐트러진 생각에 못 이기고 돌아가곤 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가자 그토록 어려웠던 글줄이 풀리면서 샤갈의 생애를 읽어 내려갔다. 첫 사랑이 아니어도 온종일 생각나는 너의 얼굴. 주말 드라마보다 익숙하고 뻔한데도 알고 싶고 두드리고 싶고 열고 싶은 네 마음. 가녀린 영혼도 상처 받기 쉽고 상처 받을 존재라고 지긋이 웃으며 말해줄 샤갈의 색채에서 사랑을 느낀다.
액자 가까이 얼굴을 들이댈 때마다 다소곳이 서 있는 내 얼굴이 비친다. 다시 연애하면 쓰고 싶다. 시. 잠시 샤갈의 화사한 빛깔에서 우울함이 덮어졌다. 더, 완전히. 덮으려면 샤갈의 모든 작품을 만지고 느끼고 보아야 그래야 덮어질 것 같았다. 지금의 생각나는 감정이라도 적어둘까?
뉴스가 코로나를 덮은 것처럼 샤갈이 우울함을 덮었고 마음 속 강물 같은 시가 샤갈을 덮으려고 할 때 아주 익숙해서 미쳐 돌아가실 자음 모음이 모든 감정을 덮으려고 했다. 술 냄새라도 닿을까 혓바닥을 풀어주느라 바빠졌다. 받지 말까 받아 버릴까, 무시하고 걸어가려다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성까지 붙여서 부르지 말라니까.
“유지애! 안 받을 거야?”
걸음을 멈추고. 멈추었던 우리 관계를 떠올렸다.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좀 벌려고 아등바등 앞만 바라봤다. 다시 한 번 불러줘. 날 붙잡아줘. 제발.
“유지애!”
울고 싶다. 좋아서. 네가.
분다, 다시 불어온다. 내 이름처럼 아름다운 청춘이여.

'오피니언 > 지애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애문학] 창세기 설화: 음욕(淫慾) (0) | 2021.05.02 |
|---|---|
| [지애문학] 체벌 (0) | 2021.04.28 |
| [지애문학] 하고 싶다고 진짜 (0) | 2021.04.27 |
| [지애문학] 기억을 기억하는 이유 (0) | 2021.04.07 |
| [지애문학] 잊어버려야 할 때 (0) | 2021.02.24 |
| [지애문학] 퇴근 길 (0)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