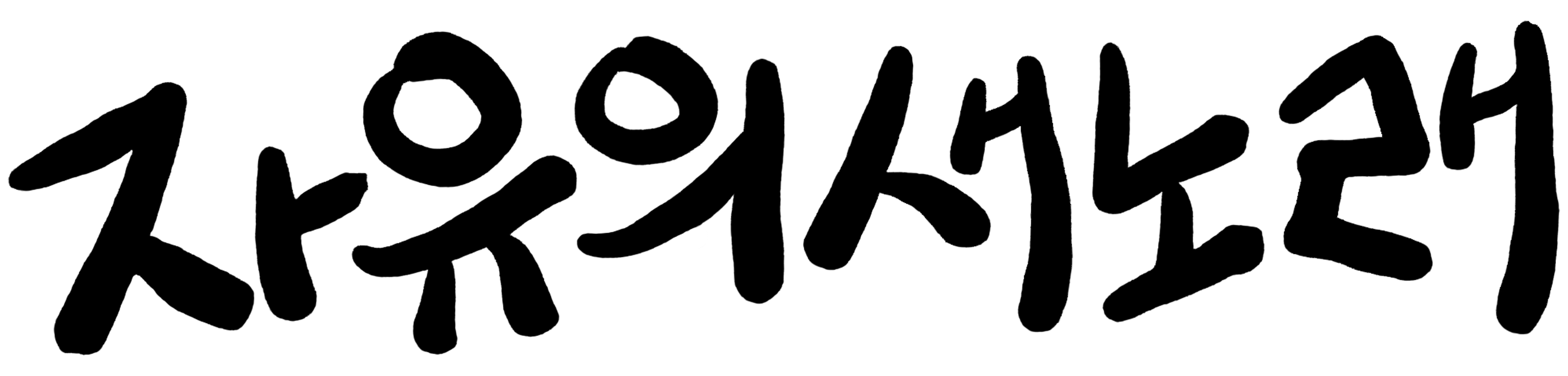입력 : 2018. 09. 09 | 수정 : 2018. 09. 10 | A30
다시 쓰는 恩惠史, 교회편: 나는 어디로 가나 <4>
하교 중이었다.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 평소처럼 놀려대는 말이었는데, 그 평소가 지윤이에겐 평소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자 째려봤고, 움찔!해진 나머지 저미어든 아픔을 그제야 깨달았다.
미안하단 말도 하지 못했다. 뚝뚝 떨어지는 눈물에 더는 다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지윤이를 좋아했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적 무언가를 느꼈고, 뒤늦게 알아차렸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밤 10시까지 채워야 했던 첫 야간자율학습은 곤욕이었다. 평소처럼 점심엔 15분, 저녁엔 20분 방언기도하며 거룩한(?) 야자를 기다리던 차, 교회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유리가 왜 약한 줄 알아?”
“아니? 뭔데,”
“glass를 자판으로 치면 힘ㄴㄴ이래 그래서 약한 거야 ㅋㅋ”
“헐~”
워낙 학우들이 활발해선지 조용한 곳을 찾아다녔고, 해 떨어져가는 황혼을 뒤로한 채 교정을 누비며 30분이건 1시간이건 누나와 대화를 이어갔다. 전화 받지 않는 날도 있었고, 전화 받는 날도 있었다. 이상하게 전화 받지 않는 날이면 서운했고, 서운한 감정도 조금씩 커져갔다.
누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 땐 인식하지 못했다.
좋아한다는 감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절제 방법도 모른다는 의미기도 하다. 마음이 불편하면, 오늘 기도하지 않은 탓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하느님의 보호 덕분이었다. 이 미신적 사고를 그 땐, 알지 못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 한 번 전화를 걸었고, 무슨 일이 있으리라 마음으로 매듭졌다.
학교생활은 힘들었다. 밤 10시에 야자가 끝나지만, 담목은 특별새벽예배를 진행하니까 꼭 나오라고 압박해댔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새벽은 깨워야지하고 새벽 예배로 도서관을 잊으려 애를 썼다. 누나를 좋아하다 못해 사랑까지 하게 된 상황에 집착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건 나뿐이었다.
그 날도 무거운 몸을 싣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10시 이후에 운행하는 유일한 버스를 탔다. 번화가에서 우연히 본 누나가 참 괘씸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싸늘해져가던 10월, 사랑으로 뜨거웠던 가슴은 척박하고 싸늘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가장 훌륭한 포도주가 가장 독한 식초로 바뀔 수 있듯, 깊은 사랑도 한 순간 가장 지독한 혐오로 바뀔 수 있다지 않은가.
교회에서 누나를 배제하기 시작했다. 인사를 건네도 인사를 받지 않았다. 농담도, 애정도, 우애도, 상심과 좌절을 감추고, 냉대했다.
교회는 여름과 겨울이면 흰돌산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간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 가면 항상 감정을 붙잡기 힘들었다. 심지어 담목이, “이번 수련회에서 재현이가 최초로 안 삐졌대!”하며 설교 시간에 가장 은혜 받은 수련회를 흩어놓기도 했다. 수련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 중이었다. 우연히 앉은 식탁 중앙에서 서로 간 의견을 묻는 모습을 보고, 담목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 성령충만해지니까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네”
나도 성령충만 문제로 생각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성령이 내주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아침, 등굣길 30분 간 이어폰을 울리던 영산싱어즈와 팀조수아 멜로디는 지금도 가끔 듣곤 한다. 성령충만을 지키기 위해 방언으로 기도했고, 새벽 어간까지 눈물로 울부짖기도 했다.
유독 누나 앞에서 성령충만이 지켜지지 않아 원인을 모르던 차, 교회를 떠날까 싶었다. 극단의 선택 앞, 한창 읽던 스가랴 12장에서 야훼의 말이 스쳐지나갔다. 유다를 구원하겠다던 야훼의 말이 위로가 돼 한사코, 교회에 등진 몸을 돌이켰다.
그 때, 과감히 교회를 떠났어야 했는데.
멀지 않은 날, 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다. 어려서부터 아부를 잘 떨었다고.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 하길 즐겨했다고. 그런 네가 왜 냉대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영적 세계와 보편 사회라는 이분법. 인간성의 상실이었다.
'연재완료 > 신학; 신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래서 안 된다는 거다] 종교인 납세, “세금을 내던가, 관리를 잘 하던가” (0) | 2018.10.09 |
|---|---|
| [교회 安 이야기] 율법과 냉대 (0) | 2018.10.02 |
| [다시 쓰는 은혜사] <5> 무너진 공간. 서서히 빗장을 연다는 건 (0) | 2018.09.17 |
| [다시 쓰는 은혜사] <3> 한 여름의 침묵 (0) | 2018.09.05 |
| [법정에 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성폭행 사건 보도 일지 (0) | 2018.09.01 |
| [다시 쓰는 은혜사] <2> 기억이 소거된 그 곳, 방송실 (0)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