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 사범님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택권!’ ‘사범님’까지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문을 열다가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흐려진다. 어색한 웃음과 인사에 유 사범이 진지하게 받는다. ○○태권도 사범으로 알려진 유 씨의 기억이 흐려졌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성씨가 ‘유’인 점만 기억한다.
◇남자다운 면모 드러내었지만 남자다움 강요 않던
유 사범은 남자였다.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상남자다. 민재(가명), 다이어트 시켜준다고 1박 2일 분교를 빌려 다녀온 수련회에서 조 이름을 ‘다이어트’로 결정했을 정도다. 내가 무슨 조였는지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민재가 속했던 유 사범 조 이름은 또렷하다. 궁서와 바탕의 중간체를 펜으로 써 내려간 ‘다이어트’ 네 글자가 인쇄 글꼴보다 선명하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다움은 폭력이다. 허나 유 사범은 폭력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강제 다이어트 들이밀기는 했지만 나와 동생에게 대해 준 태도를 곱씹어보면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두 가지를 느낀다. 나는 줄곧 그 성향을 ‘섬세함’으로 표현한다. 유 사범은 섬세한 사람이었다. 남자다움과 섬세함이 만나 좋은 사람,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데. 이름 중 성씨만 기억나는데서 아쉬움이 밀려온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철없는 화가 많을 나이임에도 정답다. 칼날도 쓰기 마련이다. 나쁘게 쓰면 살인자, 좋게 사용하면 예술가. 아이들 인품을 다룬다던 사범이 섬세함을 갖춰야 할 이유다. 제격에 맞았고 의지가 분노로 표출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저 친구들이 인사하는 게 장난으로 보이나. 다시는 그런 장난 말았으면 해.” 볼품없이 흐려지는 인사에 내 얼굴이 뜨거워진 이유다. 고개를 꾸벅 숙이고 사라진 고등학생 형들을 보고서 인사 때마다 이름까지 명확한 발음으로 큰 목소리와 함께 사범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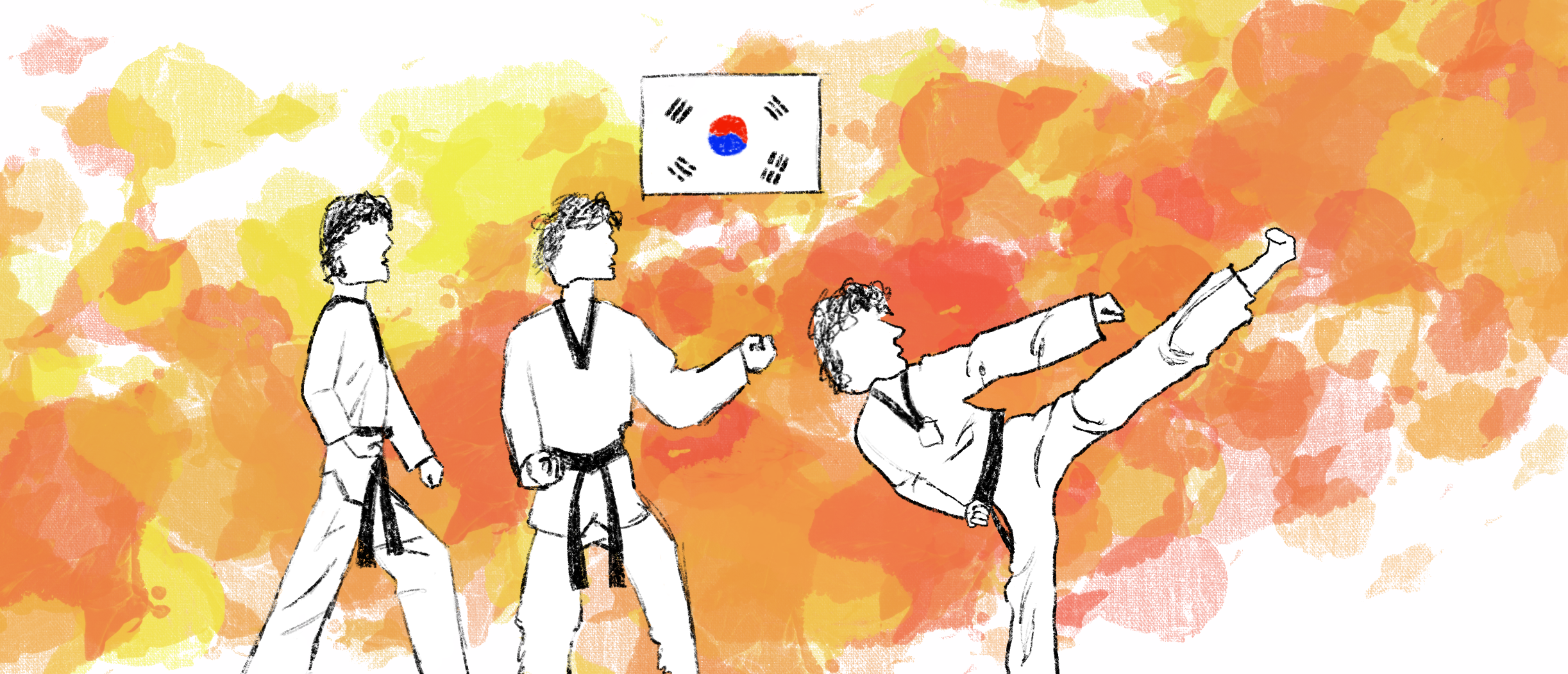
초등생 시절 철없고 뭣 모를
장난스런 경례도 받아주며
섬세하게 가르치던 유 사범
◇명상의 헛소문을 피해 달아난 체육관
유 사범은 명상을 좋아했다. ‘사랑과 우정 사이’를 부르는 이유도 명상과 함께 접했기 때문이다. ‘이젠 떠나리~’ 애절하게 부르는 남성 가수의 노래 속에 눈을 감고 상상 했다. 아무 생각도 않으며 어둠 속 침잠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 나이엔 어색하고 졸립기도 했다. 뇌를 쉬어야 했던 학부 시절 명상의 가치에 눈을 떴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음. 쉼 속에서 간지러움이 피어올랐다. 유 사범이 강아지풀을 둘고선 내 코에 닿았다 떼기를 반복했다. 아무 반응 없자 내게 참을성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마지 않았다. 실은 정말 괜찮았을 뿐인데. 빈틈을 내보여도 부끄러워 않을 줄 알던 사람이다.
정겨움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틈에서 불편함이 다가왔다. 명상은 뉴에이지(New Age) 음악이며 우상숭배라는 가르침이 흐름을 깨뜨린 것이다. 이상하게 머리가 아팠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 교회 사모가 가르친 말 한마디가 몸 구석구석 영향을 끼쳤다. 명상만은 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달리 보였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 명상을 하는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어야 했는데.
권○○ 사범이 그만두었다. 체육관이 술렁였다. 논란을 잠재우려 관장이 나섰다. 태극기 앞에다 의자를 두고 해명에 나섰다. 갑작스런 퇴장에 아우성은 그칠 줄 몰랐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범을 생각하던 애틋한 감정이란 아우성과 비교할 바 못 되었다. 머지않아 태권도를 그만두어야 했다. 권 사범 때문이 아니다. 주일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수련회에 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명상까지 해야 했던 불편함은 덤이었다.
누구보다 아쉬워했던 사람은 유 사범이다. 나와 여동생을 애틋하게 생각하던 사범의 낯빛이 아쉬움 이상의 한숨으로 가득 찼다. 서운함은 아니었다. 풀어헤친 인연, 끊어지는 관계 속에 헤어짐은 막지 못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분의 이름이 지금도 떠오르지 않는다. 유. 하나의 성, 그 얼굴을 기억하며 다시금 입술에 담는다. 보고 싶은 어른, 유 사범.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마운 이름들④] “원주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감자탕집 아저씨는 길 잃은 절 아들처럼 저녁 차려 베푸셨죠.” (0) | 2022.07.20 |
|---|---|
| 옥한흠은 인간관계 주목했고 조용기는 교회성장 바라보다 (0) | 2022.07.10 |
| “교회 건물이나 키우는 신앙이 소년을 망가뜨려” (0) | 2022.07.10 |
| [고마운 이름들②]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며 떠올린 평범한 친구들 (0) | 2020.12.08 |
| [고마운 이름들①] 고마운 그 이름들, 모두 기억하세요? (0) | 2020.08.28 |
